2024. 8. 22. 22:08ㆍ커뮤/로그
머릿속이 자꾸만 헤집어진다.
원망하는 말, 비난하는 말. 그리고 이전부터 쭉 나를 보는 시선마저.
이런 걸 피해망상이라고 하던데.
여러 개의 목소리가 내게 부정적인 감정을 주입했다- 고 말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고통은 끊이질 않았다.
모두가 나를 나쁘다고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았다.
그래, 이런 시선은 사실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어.
나는 태어나서부터 쭉 이런 시선 속에서 아득바득 살아남았으니. 하지만···
지금이라면 상황은 다르다.
축제 기간 동안 사람들과 많이 친해졌다고 믿었다.
그들과 친구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그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갔다고 생각했었다.
사태가 터진 후에도 마찬가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기울인 만큼 내가 몰랐던 또 다른 이야기들을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지?
모두가 나를 악인[悪人] 취급하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시선이 한없이 두려워졌다.
물론 그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과분하겠지만, 나를 사랑한다고 소리를 내었던 사람도 있었으니까.
허나, 이 고통을 나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지?
만약에 평생 동안 이 고통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그럴 바에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나?
나아갈 수 없는 거라면. 그렇다면.
걸음을 떼었다.
원래 걸음이라는 게 이렇게나 무거웠던 거였나.
여전히 나만을 향하는 시선에, 눈을 잔뜩 내리 깔고서는.
한 층, 두 층.
부수어진 학원을 뒤로하고 옥상으로 걸음을 옮겨 마침내 도착했다.
이제는 이 문을 열 수 있어.
차가운 금속 재질의 손잡이를 잡아 돌려 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던 옥상에 다시 도달했다.
숨을 들이켰다.
여름밤의 공기는 습하고 조금은 더웠다.
주위를 둘러다 본다.
많은 이들이 이곳에 도착했고, 이곳에 왔었던 사람들 중 거의 대다수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다시는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리운 이름들이 떠올랐다.
다시, 걸음을 옮겨.
오늘따라 걸음이 무겁다. 발에 족쇄라도 걸은 것 마냥.
나중에는 다리에 힘이 점차 풀려 발을 끌듯이 걸어 다녔다.
-끝에 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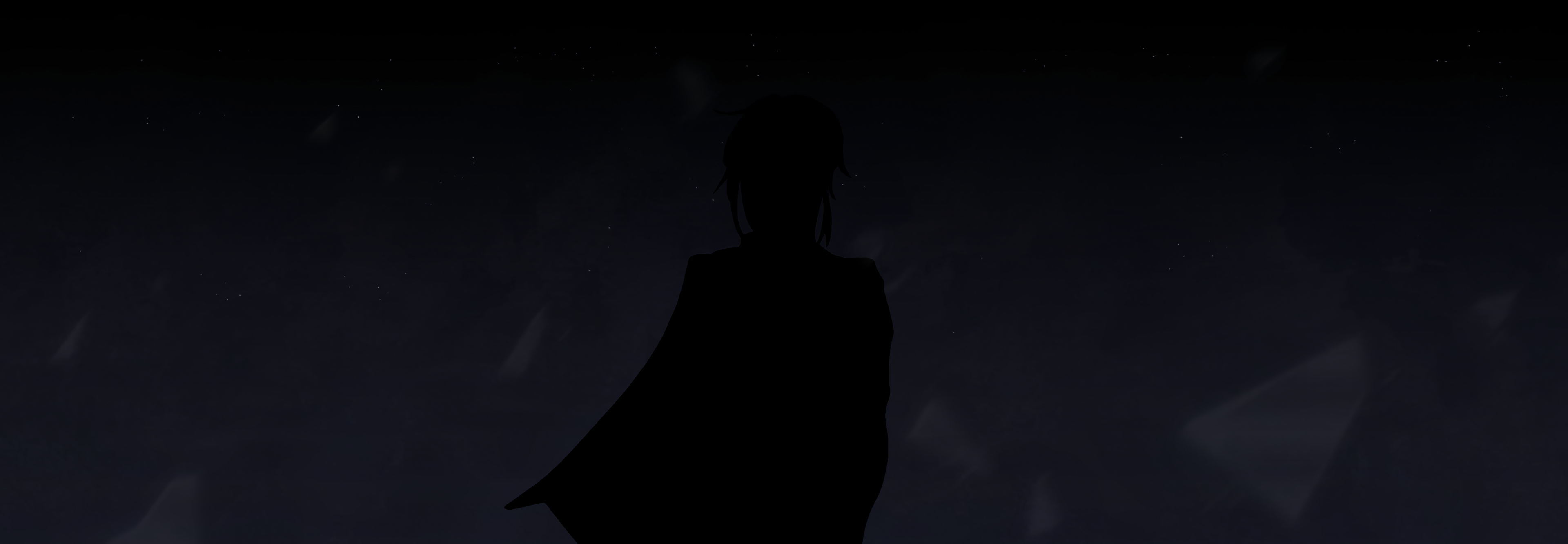
두 발을 전부 옥상의 끄트머리에 올려다 두었다.
제삼자의 시선에서 본다면,
위태로워 금방이라도 앞으로 쓰러질 것만 같이.
바람이라도 크게 불게 된다면, 바람에 의해 균형을 잃어 이 앞으로 추락하겠지.
추락.
밑을 내려다보았다.
아득할 만큼 멀고 멀은 바닥이 눈에 보인다.
원래 이렇게나 우리 학교가 높았던가, 따위의 생각을 하면서.
아니, 잡생각 하지 말자.
호흡을 가다듬었다.
눈을 가늘게 떠, 아래를 쳐다본다.
여기서 정말, 단 한 발자국만 딛게 된다면.
나의 몸이 저 아래로 추락해 터져 버릴 것이다- 다른 이들이 겪었던 것처럼.
아니면 온몸이 바스러질까? 짓뭉개질까.
···하지만 뭐가 되었든 간에 결국은 죽는 거잖아.
그래,
이제 생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몸을 맡기는 거다.
저,
하늘에.
······
아아,
······아니.

난 할 수 없어.
죽는 것이 무섭다.
두려워,
너무 무서워.
난 못 하겠어.
무섭지 않은 척을 해봐도, 당당한 척을 해도. 그럼에도 두려운 것이 있고···
결국 죽어버린 그들 만큼의 용기도 없는.
그래, 나는 겁쟁이다.
여름날 옥상의 아래는 아득히 멀고, 두려울 뿐이라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를 크게 내뱉고, 발을 헛디뎌서, 뒤로 넘어졌다.
끝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지평선을 바라봐.
다시, 고개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아, 하늘에 수 놓인 별들이 불쾌할 만큼 아름답던가······.
아무도 없는 옥상에서 홀로 울음을 토해냈다.
죽기 싫어서, 사는 게 무서워서.
떠난 이가 그리워서, 떠난 이를 여전히 사랑해 놓는 법을 여전히 알지 못해서,
바보같이 정만 많아서.
심장과 이 마음 전부 토해내라 울었다.
그래, 어쩌면.
지금 나의 이 행위 자체는 먼저 사라져 버린 이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테니.
죽고 싶으나 살아가야 했고, 내가 살길 바라는 사라진 이들의 마음을.
내가 감히 배반할 순 없는 것이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내밀었던 발을 돌려 되돌아간다.
옥상의 차가운 손잡이를 다시 잡아 돌려 열고는.
뒤 돌아 옥상을 슬 훑어보다가 떠났다.
이곳에 다시는 아무도 오지 않길 바라면서,
내 바람이 헛되지 않길 바라면서.
차라리 이 모든 게 하나의 꿈이기를.
'커뮤 > 로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떠나간 삶을 기록하며 (0) | 2024.08.21 |
|---|---|
| 무제 (0) | 2024.08.20 |
| 천천히 내려앉는 (0) | 2024.08.06 |
| 다시, 熱帶夜 아래서 (0) | 2024.07.16 |
| 後悔의 生에서 (1) | 2024.05.18 |